하지만 우리가 중국을 얕잡아보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예년만 못하다고 하지만 올해도 한국보다 2배 높은 5% 가까운 성장이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지도 오래다. 경제 수준이 낮아 한국 제품과 문화를 흠모하던 중국은 더 이상 없다.
오히려 이제는 한국이 중국을 흠모하는 사대 성향이 다시 짙어지고 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불렸던 중국 제품들은 어느덧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만큼 높아진 기술력 때문이다.
삼성·LG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던 국내 소비자들은 어느덧 중국의 로봇 청소기에 열광하고 있다. 중국의 로봇 청소기 브랜드 ‘로보락’이 국내 시장점유율 1위(35.5%)에 올랐을 정도다.
대표적인 B2B 산업인 철강과 화학은 중국산의 잠식으로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심상치 않다. 일부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생존의 기로에 내몰린 상황이다.
중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은 공식이 있다. 자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 곧장 한국 상륙을 추진한다. 미국·유럽 시장의 장벽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은 접근성과 규모를 갖춘 귀한 ‘고객’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新)품질 생산력’을 외치며 기술 제품의 해외 수출을 독려하고, 생산과잉이 중국 경제의 고질병이 되면서 한국 시장 공습은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1980~1990년대에 소니·파나소닉 등 일본 제품에 열광하던 우리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삼성·LG·현대차 등 국내 제품에 길들여지기 시작했다. 제품의 품질이 그만큼 향상되기도 했고, 일종의 ‘애국 마케팅’도 작용한 결과다.
“TV는 삼성(LG), 냉장고 하면 LG(삼성), 자동차는 현대”. 이것은 하나의 소비 공식처럼 자리 잡았고, 기업의 성장과 기술력 개발로 다시 이어졌다.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USA'에 열광하던 우리는 'K-반도체' 'K-자동차' 'K-가전'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는 것을 보면서 자랑스러워 하고 한국인임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수십 년간 온 국민과 기업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K-자부심'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중국처럼 정부 차원에서 기업을 밀어주겠다는 선언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온갖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 한국형 샤오미나 알리바바를 만들어낼 제도적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주변국으로 전락하고 만다. 정신을 차리고 묘수를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소비자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에 열광하는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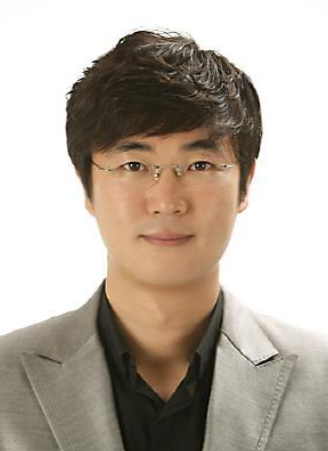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