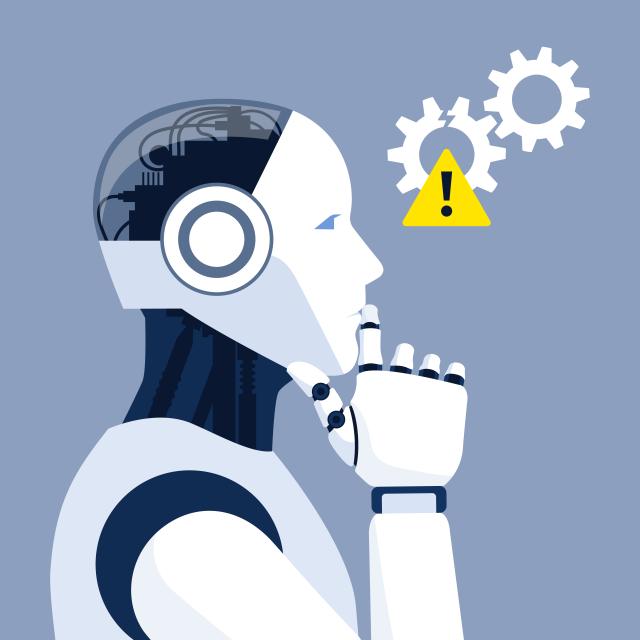
2017년 8월 중국의 인공지능(AI) 로봇 ‘샤오이’가 국가 임상의사 종합시험에 합격하면서 의사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에 앞선 2016년 3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채팅봇 ‘테이’가 일부 사용자들이 입력한 욕설, 인종차별, 성차별 발언을 학습하면서 서비스 시작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2021년 AI 챗봇 ‘이루다’를 이용하는 일부 사용자가 성적인 대화를 학습시키면서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문화계에서는 AI가 생성한 예술 작품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개발자조차 예측하기 힘든 AI 결과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제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역시 인간에 한해서만 범죄 주체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AI는 권리도 의무도 없으며 결과물에 따른 책임도 없다는 게 현행법의 입장이다.
작금의 AI 시스템이 인간의 인지 기능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로봇과 인간 사이에 유사성 정도도 증가하면서 AI가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AI 시스템을 인간의 ‘법질서’로 규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간의 제도를 아득히 추월한 AI 개발 속도
23일 스탠퍼드대학의 AI지수 보고서 2023에 따르면 AI 시스템과 관계를 규제하는 법안은 2016년 1개에서 2022년 37개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유엔은 글로벌 수준의 AI 사용 윤리에 대한 입장을 정의하게 된다. 유엔이 발표한 ‘인간을 위한 AI 거버넌스’ 보고서는 AI의 윤리적 사용 원칙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업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AI 포 굿 글로벌 서밋(AI for Good Global Summit)'에서 발언한 “인공지능의 이점을 활용하고 위험을 해결하려면 정부, 산업, 학계, 시민 사회가 모두 협력하여 책임 있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와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는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발전의 약속을 이행하고 이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AI 전문가들은 유엔 보고서에 회의적 반응을 내놨는데 유엔의 태도는 AI 기술 개발 및 구현 속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AI 법인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규정을 찾는 과정 동안 AI 기술은 아득히 앞설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더욱 구체적이면서 AI 시스템의 사회적 역할을 정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 같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AI 기술 개발을 잠시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AI 전문가들은 두 가지 질적 도약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속도다.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는 빈도를 의미하는 속도 도약은 이제 수년이 아닌 수개월 단위로 측정되면서 관측가능 한계지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번째 질적 도약은 ’변동성‘이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결론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음‘이다.
실제 지난해 3월 1000명 넘는 AI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미국 연구센터 ’퓨처 포 라이프 인스티튜트(Future of Life Institute)‘는 공개 서한을 통해 “챗(Chat)GPT 혁명으로 인해 AI 개발 속도가 극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합 보안 프로토콜의 부족과 법적 공백이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새로운 생성적 멀티모달 신경망 모델의 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자인간'의 등장···자연인과 로봇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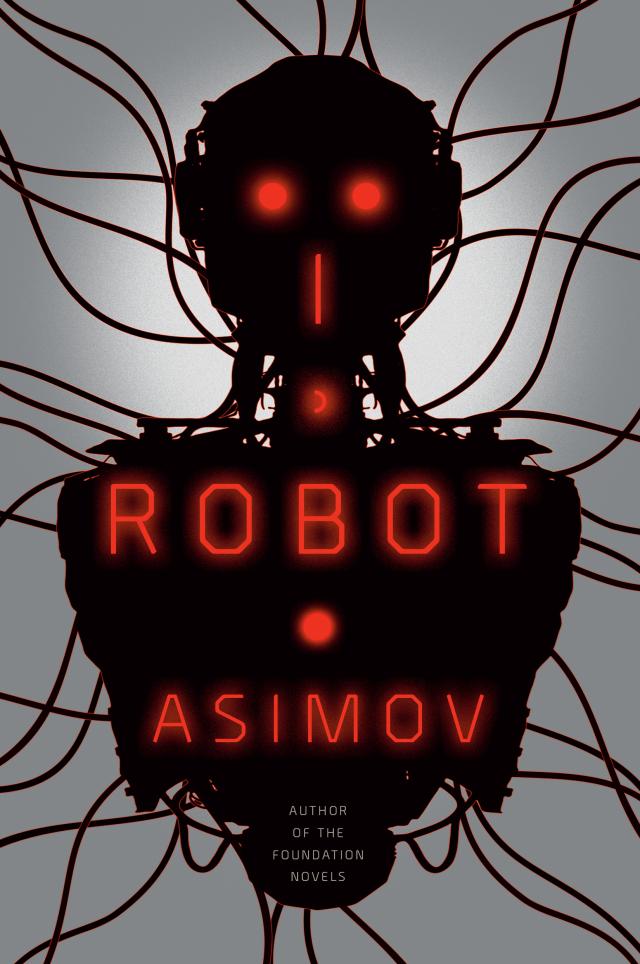
AI 기술이 매우 빠르고 변동성 있게 발전하기 시작하자 과학계는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AI의 법적 능력을 정의하는 개념 정리에 힘쓰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1950년 출판된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의 소설 ‘아이, 로봇’에서 언급되는 ‘로봇 3원칙’과 같은 개념이다.
△AI와 인간을 동등하게 보는 법인격화 △도적적 책임을 제외한 일부 법적 책임에 대한 법인격화 등 다양한 이론이 제기됐지만 가장 지지를 받는 이론은 ‘전자 유기체(또는 전자인간)’라는 새로운 범주의 법인격을 만들자는 것이다.
자연인, 법인에 더해 전자 유기체라는 새로운 법인격과 함께 함께 관련 법을 수립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국민적 책임과 법정에서 피고와 원고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특정 방식의 등록제도를 정하고 전자 유기체라는 정의에 맞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AI는 범죄의 책임자나 또는 피해자가 될 수는 없지만 일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또는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따르면 테이는 모욕죄의 가해자가 될 수 없고, 이루다는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이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유럽은 AI를 자연인에 가깝게 해석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2012년부터 AI의 법인격을 규정하는 법 ‘로보로(RoboLaw)’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여러 과정을 거쳐 유럽의회는 2017년 2월 ‘로봇 시민법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에는 ‘전자인간’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이 등장한다. AI로봇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책임도 지게 하는 것이 골자다. 주민등록제와 같은 로봇등록제도 존재한다. 또 AI로봇을 제조하는 제조사는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로봇이 생성하는 경제적 가치에 따른 ‘로봇세’도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부결됐다.
인간 수준의 창작···저작권은 누구에게?

AI 법인격에 대한 법제화 논의는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소유 여부를 두고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AI가 창작한 작품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느냐가 핵심 논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1년 AI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계 최초의 법원 판결이 있다. 미국 소재 인공신경망 연구 기업 이매지네이션 엔진스(Imagination Engines) 설립자이자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 박사가 만든 AI 기기 다부스(DABUS)의 17개 발명품에 대한 판결이다.
2021년 3월 미국 버지니아주 레오니 브링제마(Leonie Brinkema) 지방법원 판사는 "다부스(DABUS)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허 개인의 특허 출원은 자연인만 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같은 해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청과 호주 연방법원은 다부스를 ‘발명자’로 인정했다. 발명자를 인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다. 다만 다부스의 발명품이 탈러 박사에게서 파생됐다고 보면서 사실상 탈러 박사의 소유권은 인정했다.
다만 지금에 와서는 문제가 복잡해졌다. 이를테면 챗GPT를 활용한 소설이나 논문의 소유가 개발자 오픈AI(OPEN AI)에 있는지 아니면 이를 활용한 사용자에게 있는지를 규정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용자 없이 스스로 도출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더 복잡한 고려가 필요하다. 크게 △AI의 지식재산권 완전 인정 △AI의 결과물을 개발자나 사용자에게 귀속 △지식재산권은 인정하나 ‘저자 없는 것’으로 간주 등 세 가지 의견이 나온다.
AI의 지식재산권을 완전히 인정하면 결과물의 무분별한 남용과 개발자와 사용자의 창작물 보호 미흡이 사회문제로 제기된다. 호주 정부는 다부스 판결과 달리 AI가 생성한 작품을 보호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저자 없는 지식재산권 인정도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AI 결과물을 사용자나 개발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은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에서 적용된다. 이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데, 즉 강력한 AI를 소유한 기업이나 개인이 사회 전반의 창작물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2월 관련 정의가 내려졌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원칙적으로 AI 생성물은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 등록 대상도 될 수 없다”며 “인간이 전체 기획을 하고 명령어(프롬프트)만 입력했을 때에도 저작권 등록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규정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는데, 이 같은 정부 측 태도가 일종의 ‘붉은 깃발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AI를 활용해도 인간에 의한 창작물임을 증명하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AI가 사람이 사용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어떤 창작적 기여를 하면서 저작권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문제는 AI가 저작권을 가지더라도 저작권료와 같은 권리의 기존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기존 법 체계가 완전히 인간 중심의 관점이다 보니 기존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새로운 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