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차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괸계망서비스에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개발도상국이 애용하던 전략을 하나씩 꺼내 들고 있다”며 “글로벌 통화 질서의 설계자인 미국이 지금 시장 밖의 장치들에 의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미국은) 정치적으로 이성적인 해법이 불가능하고, 시장에 맡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미국) 국가부채는 33조 달러를 넘었고, 이자 비용은 국방비를 초과했다. 국채금리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있다”며 분석했다.
이어 “증세는 불가능하다. 복지를 줄이면 표를 잃고, 감세를 철회하면 당을 잃는다”며 “정치가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국가는 ‘통제’라는 고육지책을 꺼내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 전 차관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모든 관세 전략이 일관된 설계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관세) 통제는 트럼프가 치밀하게 설계한 구조이기보다는 무너지는 체제 안에서 감각적·본능적으로 꺼낸 선택들이 결과적으로 엮인 정치적 반응 체계에 가깝다”며 “그는 설계자이기보다는 붕괴의 속도를 앞서 읽은 직감형 통제자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날의 서구 선진국 대부분은 ‘시장에 맡길 수 없는 재정’과 ‘정치가 감당하지 못하는 개혁’ 사이에서 조용하고 분명하게 통제의 언어로 돌아서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비단 미국만의 사례가 아니다”고 분석했다.
그 구체적인 예로 김 전 차관은 독일과 영국, 일본 등을 꼽았다.
그는 “독일은 가장 보수적인 재정 규칙을 가진 나라로, 헌법에 균형재정 원칙과 연방정부의 적자 상한선을 명문화했다”며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에너지 전환, 인프라 낙후라는 삼중 위기 앞에서 결국 적자의 문을 열었다”고 했다.
또 “영국은 감세 실험이 실패하자, 시장에 버림받는 공포를 경험했다”며 “이후 통화·재정 정책은 시장 심리의 신경계에 붙들려 조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도 “금리 제어와 자국민 국채 보유, 중앙은행의 통화 조율로 성장은 포기했지만, 시스템은 지켜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통제는 단순한 퇴보가 아니다”며 “그것은 합의 불가능한 민주주의와 시장에 맡길 수 없는 부채 사이에서 국가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의 장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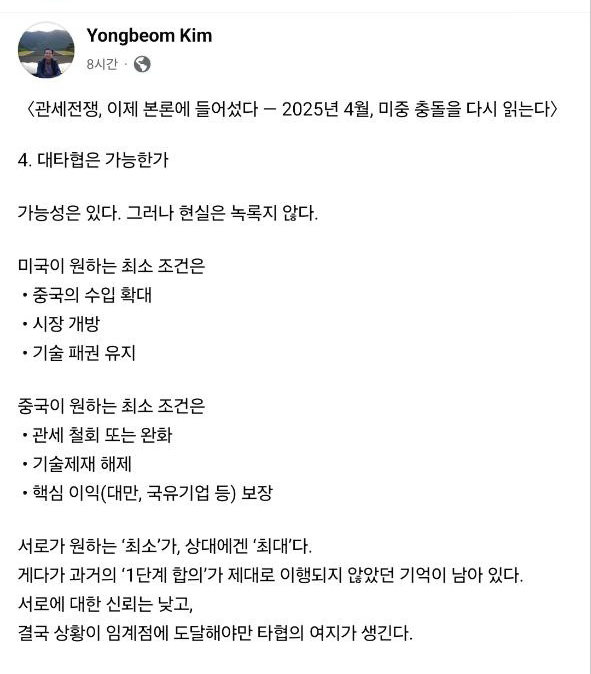
김 전 차관은 9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관세 정책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자기 개혁 없이 외부에 책임을 돌리고, 통제의 칼을 먼저 꺼내 들며 시장을 불안에 빠뜨리는 방식은 패권국인 (미국의) 리더십은 매우 아쉽다”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부채 조정(debt adjustment)’이다. 단순한 지출 축소나 적자 해소가 아닌, 금리가 국가의 미래 설계를 제약하는 새로운 질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지금, 위기를 느끼는 민감성과 그 구조를 설계하는 전략적 상상력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며 “감당하지 못한 자는 주변화되고, 구조를 감당한 자만이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타협의 가능성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특히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결국 임계점에 도달해야만 타협의 여지가 생길 것이다”고 내다봤다.
김 전 차관은 “한국은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의 정중앙에 있다”며 “(앞으로) AI와 기술 표준 등과 관련 어느 쪽의 기술 생태계에 묶일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싸움은 더는 관세율 몇 %의 문제가 아니다”며 “산업과 기술, 체제의 설계 권한을 둘러싼 구조적 충돌이고, 자유무역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망은 전략화됐고, 관세는 외교정책이 됐다”며 “세계는 중심을 잃고 다시 짜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