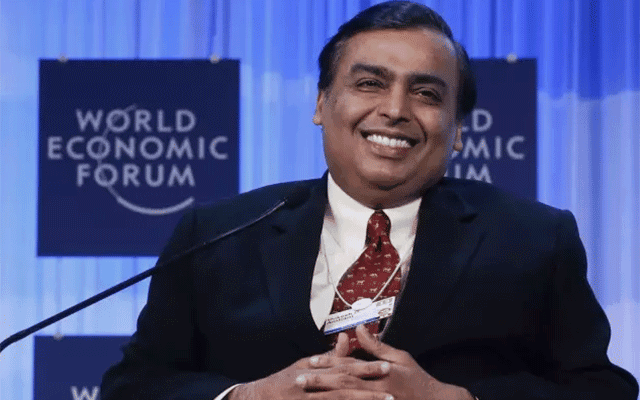
무케시 암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 [사진=바이두]
중국에서 가장 핫한 기업인인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아시아 최고 부호의 자리에서 밀려났다. 그를 밀어낸 것은 아시아의 '코끼리', 인도의 재벌 2세인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이다. 능력있는 재벌 2세이자 사치스러운 야심가로 최근에는 '인도판 아마존'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중국 관찰자망(觀察者網)은 15일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인용해 무케시 암바니 회장이 13일 기준 총자산 443억 달러로 440억 달러의 마윈 회장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 부호의 왕좌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무케시가 이끄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주가 급등이 주요 배경으로 13일 1.6% 상승 마감하면서 아시아 부호 순위도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2007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 부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인도의 억만장자, 무케시 암바니는 누구인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케시를 "러에코의 자웨팅(賈躍亭) 같은 모습에 오포(OPPO)의 방식으로 홍콩의 리카싱(李嘉誠) 청쿵그룹 회장을 뛰어넘고 인도의 스티브 잡스가 됐다"고 표현했다.
무케시는 1957년 4월생으로 인도 뭄바이대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으며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MBA)을 1년간 다니다 자퇴한 뒤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이자 릴라이언스 그룹 창업자인 디루바이 암바니는 '중국판 정주영'으로 불리는 인물로 10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단돈 5만 루피(약 150만원)로 거대기업을 키워냈다.
무케시는 1986년 디루바이가 심장마비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남동생 아닐과 함께 경영 일선에 뛰어들었고 그룹의 성장과 확장을 주도했다. 문제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였다. 2002년 디루바이가 별세하면서 형제간의 치열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것. 두 형제의 싸움은 3년이 넘게 계속됐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인도 증시를 흔들고 인도 경제를 위협할 정도였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나서 형제를 중재했고 승리의 여신은 무케시의 손을 들어줬다. 릴라이언스 그룹이 둘로 쪼개졌지만 핵심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와 정유, 유통 등을 무케시가 차지했다. 아닐은 통신, 금융, 전력 사업을 가져갔다.
양보없는 경영권 분쟁에서 엿볼 수 있듯이 무케시는 재벌 2세였지만 무능력하거나 나약하지 않았다. 도전하는 대담함과 결단력이 있었다. 통신시장에서의 성공이 이를 잘 보여준다. 2000년대 초반 인도 통신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전망이 비관적이었지만 무케시는 과감하게 뛰어들었고 인도 4대 통신업체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세계 2대 휴대전화·통신 시장인 인도의 4G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지만 무케시는 여전히 야심차다. 이달 초 2억1500만명의 통신 고객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로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선언하고 '인도판 타오바오', 나아가 '인도판 아마존'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시아 최고 부호의 자리를 빼앗더니 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마윈 회장에게 도전장을 던진 셈이다. 오는 2025년까지 기업 규모를 2배로 확대하겠다는 '엄청난' 목표도 제시했다.

무케시 회장의 초호화 저택인 안틀리아. [사진=바이두]
이러한 거침없는 경영 스타일과 달리 무케시는 내향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사치스러운 억만장자로도 유명하다.
무케시 가족의 초호화 저택이 대표적이다. 2011년 무케시는 거금을 들여 뭄바이에 27층(실제 60층 높이) 저택인 '안틀리아'를 지었다. 내부 면적이 베르사유 궁전보다 크고 3개의 비행기 격납고, 160대 차량 주차가 가능한 지하 6층의 주차장, 수영장과 헬스장, 스파, 영화관, 헬기이착륙장, 연회장 등 초호화 시설을 갖췄다. 이곳에 무케시 부부와 자녀 3명이 사는데 600명의 직원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무케시의 재부상은 인도의 빠른 성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도 발전하면서 억만장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자산 리서치업체 뉴월드웰스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 부호의 총자산은 전년도인 6584억 달러에서 25% 급증한 8230억 달러다. 인도에는 총 119명의 억만장자가 있으며 이는 미국, 중국 다음의 세계 3위 수준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