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TD LTE 도입은 중국이 기술 주도권 강자로 클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일부러 해주는 모양새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 주도의 주파수분할(FD) LTE보다 TD LTE의 세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테스트 베드가 돼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FD LTE의 경우 국내 업체가 원천기술을 일부 보유하고 있고 LTE 어드밴스드에서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TD LTE을 그대로 도입하기 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한 이후의 차세대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 17일 표현명 KT 사장이 와이브로와 TD LTE와의 병행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와이브로를 하지 않으려면 주파수를 반납하면 된다”고 말해 파장이 확산되자 KT는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 없으며 서비스 품질 향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지속 진행하고 있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4세대 이동통신에서 와이브로는 LTE에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서 와이브로 서비스는 2006년 상용화가 됐지만 가입자가 100만명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LTE는 사업자들이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1년만에 가입자 800만명을 넘어섰다.
사업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TD LTE와의 병행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사업자들에게는 해외에서의 TD LTE 확산과 단말기 수급의 용이성 등에 따라 사업의 유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와이브로의 미래에 대해 정부도 고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와이브로 어드밴스드 기술경쟁력 확보 방안을 내놓고 3월에는 와이브로 주파수를 재할당하면서 트래픽 폭증에 대비한 데이터 위주의 보완재로서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후 KT가 요금제를 낮추면서 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SK텔레콤은 오히려 줄었다.
새로운 와이브로 요금제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요금제 개편과 함께 내놓는 것을 방통위와 협의중인 SK텔레콤은 24일 와이브로 모뎀인 브릿지의 새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와이브로 어드밴스드로의 진화도 관심이다.
기존 대비 속도가 6배 빠른 와이브로 어드밴스드(Wibro Advanced)에 대한 기반 기술 연구는 이미 전자통신연구소(ETRI)에서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기지국 장비는 삼성전자가 내년 상용화 예정인 일본 UQ에 공급할 계획이지만 국내 공급은 미정이다.
정부는 내년 3분기 LTE 어드밴스드가 사용화되기 전 와이브로 어드밴스드 기술을 먼저 선보여 틈새시장을 노린다는 계획이지만 사업자들이 뛰어들어야 가능한 일이다.
와이브로 어드밴스드 공인시험장비 구축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반영,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만들 예정이고 무선전송 시스템을 위한 기지국 개발을 위한 사업자는 9월에 선정, 기술을 활용한 사물지능통신(M2M), 기지국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연구도 진행중이지만 실제 상용화가 문제다.
와이브로를 활용한 제4이동통신 신청도 활성화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방통위는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철수하는 등 와이브로의 입지가 좁아지는 가운데 서비스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은 한 주파수 용도 전환과 같은 제안이 다시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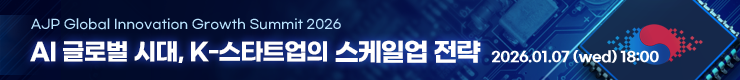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