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배석규 칼럼니스트]
대 쿠릴타이를 열려던 시도가 무산되면서 쿠빌라이는 대칸의 권위와 군사력을 통해 제국 전체를 강권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렵게 됐다. 때문에 정복보다는 경영이라는 측면에 무게를 둔 통치 방식을 고려하게 된다. 초원의 군사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재정기반을 확보해 제국 전체를 하나의 물류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그 것이었다. 그 것을 이루고 난 뒤 바다와 육지를 통해 세계로 연결해 가는 시스템, 즉 바다와 육지를 아우르는 통상제국의 건설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 = 보이르호의 물새 떼]
▶ 상도로 바뀐 개평부

[사진 = 상도성 (그래픽)]
게다가 초원과 대륙을 한꺼번에 장악하려 했던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데도 개평부가 훨씬 더 적합했다. 개평부의 이름이 상도(上都)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도 이때다.

[사진 = 상도성터]
조선도 초기에 한양과 개경 두 곳을 수도로 정했다. 이처럼 양경제의 모습이 역사상 간혹 나타나기는 하지만 쿠빌라이의 양경제는 그 것들과 다소 다른 특징이 있었다. 그 것은 상도와 중도 사이의 3-4백Km에 이르는 지역 곳곳에 크고 작은 기능도시가 들어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 지역이 모두 수도권지역과 같은 기능을 했다. 이것이 쿠빌라이 통치지역의 기본 뼈대가 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군사도시나 창고도시 그리고 공예도시 같은 것들이 이른바 수도권을 채우고 있는 도시들이었다. 거대한 타원형으로 이루어진 수도권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유목사회와 농경사회를 가르는 접경지대가 지나가고 있었다. 흥안령(興安嶺)에서 음산산맥(陰山山脈)을 거쳐 기련산(祁連山)으로 이어지는 긴 띠가 그 것이었다.
▶ 유병충이 설계한 대도

[사진 = 북해공원 일대]
그 속에는 자신의 정권획득에 도약대가 될 현재의 자리에다 통치 야망을 펼칠 터전을 마련할 계획도 들어 있었을 것이다. 대칸의 자리를 차지한 쿠빌라이는 그 때의 구상을 실천에 옮겨나가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래서 자신이 눈여겨보아 두었던 중도의 동북쪽의 호수와 섬을 중심으로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것이 바로 대도 건설의 그 출발점이었다.
그 곳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할 것을 주장한 사람은 중국인인 유병충(劉秉忠) 이었다. 유병충은 원래 승려 출신으로 유교․불교․도교에 통달하고 풍수지리에 밝은 유명한 학자였다. 스승인 해운(海雲)에 의해 금련천에 있던 쿠빌라이에게 보내진 뒤 그 곳에서 금련천 초원에 개평부 도성을 짓는 일을 주도했었다. 1266년, 쿠빌라이는 아예 도시 이름을 대도(大都)라 붙여서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 위대한 도시 대도의 건설은 그렇게 시작됐다. 유병충은 이번에도 대도의 설계를 맡았다.
▶ 천년의 역사를 지닌 도시
흔히 북경을 천년의 고도라고들 얘기한다. 북경은 거란족 요나라의 수도로 10세기에 역사에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다. 천년이상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북경은 여전히 중화문화권의 중심지로서 활기가 넘치고 있다. 한 때 ‘죽의 장막’ 속에 가리어져 있었던 이 도시는 개방의 물결을 타면서 세계를 향해 문을 열기 시작하더니 짧은 시간 안에 세계의 도시로 변모했다.
▶ 현대와 과거가 어우러진 도시

[사진 = 북경거리 시민들]
현대와 과거가 어우러진 이 정돈된 도시의 모습은 최근에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수 백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때 모습의 상당 부분을 원형으로 간직하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12세기 때까지 중국 일부분 국가의 도시

[사진 = 천안문 광장]
당시 역사의 중심지는 장안(長安)과 낙양(洛陽)이었다. 북경은 변경 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그래도 중국 북방의 핵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해왔다. 12세기 중반부터 북경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도읍지인 중도(中都)가 됐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중국 대륙 전체의 수도는 아니었다. 이들 국가는 중국 대륙 전체를 통일한 국가가 아니라
일부분을 차지한 국가였기 때문이다.
▶ 세계 개념 도입한 전체 중국 도시로 탈바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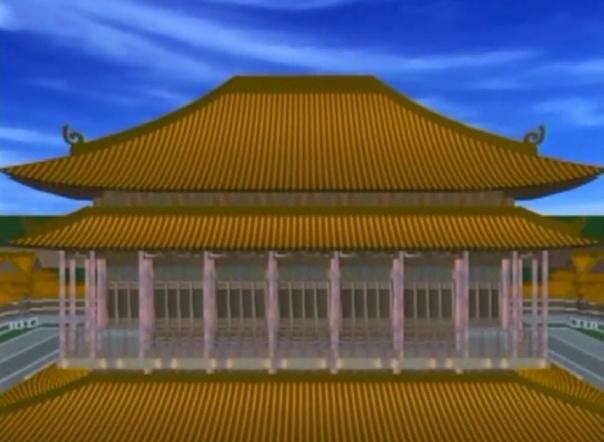
[사진 = 대도성(어원)]
물론 그 이전시대까지 이 지역에 세워졌던 대부분의 건물들은 헐려나갔고 그 보다는 몇 배나 큰 규모의 대도성(大都城)이 건설됐다. 이 도시는 이후 7백년 이상동안 거의 다른 곳에 그 중심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은 채 거대한 중화권의 수도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 육지와 바다의 제국 출발점

[사진 = 천안문광장의 필자]
하나의 통일된 중국은 그 영역을 중국 땅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육지를 통해, 바다를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가려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쿠빌라이는 육지와 바다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경영하려는 꿈을 실천에 옮긴 최초의 인물이다. 그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 역사 흐름의 대전환을 불러오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