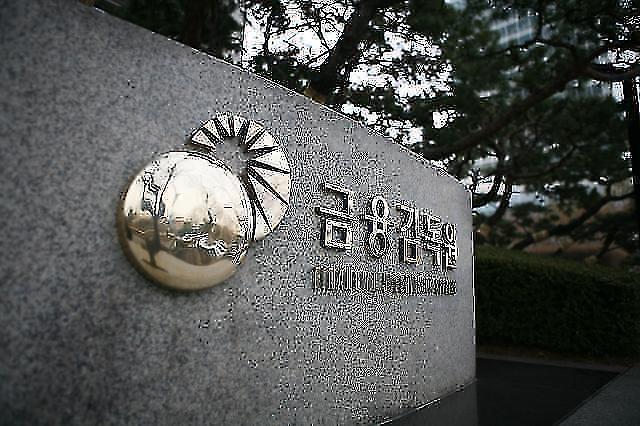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 신문광고 및 SNS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기업 A사는 검증이 어려운 호재를 유포했다. A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분쇄기를 이용한 실리콘음극재 양산에 성공했다면서 수백만주를 발행, 무인가업자를 통해 주당 1만2000원에 이를 유통했다. 하지만 유상증자 이후 2년째 매출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상장을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한 사례도 포착됐다. 비상장기업 B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구글보다 빠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기술을 개발했다며 나스닥 상장을 진행한다고 홍보, 주당 15만원에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현재 B사 대표는 구속된 상태고 주주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다.
신문을 통한 부적절한 투자광고 사례도 적발됐다. 비상장기업 C사의 한 주주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문광고를 통해 회사의 상장회사 합병 및 해외 투자유치가 확정됐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주주가 보유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청약을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비상장주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신고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비상장회사나 주주가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주 발행이나,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것은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만약 증권신고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투자권유일 수 있다.
공개된 투자정보가 허위·과장됐을 수도 있다. 비상장사는 재무현황이나 사업구조,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어서다. 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 오인 유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비상장기업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이나 기술력, 영업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투자자가 스스로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무인가업자를 통한 거래는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어 "비상장주식이 거래되는 중개시스템의 시장감시 기능이 상장증권시장 대비 미흡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통거래량도 적어 적정 가치평가가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큰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공시조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한 위법사실 확인과 행정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안내‧홍보‧교육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비상장회사 또는 무인가업자 등의 공시의무 위반 또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콜센터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 또는 제보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