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이렇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대해 비난할수록 소비자의 쌍용차에 대한 인식은 나빠진다. 쌍용차는 노조를 탄압한 악덕기업이 되고, 쌍용차 직원은 제품 이미지엔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강성노조로 오해 받는다. 쌍용차라는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 이는 곧 판매 결과로도 연결된다. 악순환이다.
무엇보다 자동차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설비투자 및 신차 개발 등을 위해 지속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인 동시에 대외 이미지가 회사의 경영실적은 물론 신인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주도형 산업이다. 따라서 자동차산업의 특성과 환경에 대한 이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하다.
노동계의 반발도 이해 안가는 바가 아니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인 차원에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단 사회적 문제와 눈 앞에 닥친 한 회사의 문제는 별개다. 사회적 논의가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고용 여력마저 없애선 안 된다. 사회의 통합적 노력을 통해 사회·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새롭게 출발한 ‘뉴 쌍용차’는 판매물량 확보 및 경영정상화를 통해 455명의 무급휴직자를 한시바삐 복귀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이미지 개선, 신제품 출시 등 갈 길이 멀다. 현 노조가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3년 연속 무파업 임단협 타결을 한 건, 사측이 제시한 조건이 파격적이어서가 아니다. 이 같은 ‘공동의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옛 동료를 하루 빨리 복귀시키기 위해서다. 모두가 아픔을 나누고 있다.
쌍용차는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해 인도 마힌드라에 피인수된 이래 빠르게 옛 모습을 되찾고 있다. 국내외 불황 속에서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1.4% 늘어난 5만6605대. 올해 11만~12만대 가량 판매할 전망이다. 중국ㆍ인도 등 신시장 개척으로 해외 판로도 100여국에 근접했다.
하지만 아직 정상 회복까진 갈 길이 멀다. 2009년 3000억원에 달하던 연간 적자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도 1500억원, 올 1분기에도 327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인력 충원, 즉 무급휴직자 복귀를 위해 필수적인 생산ㆍ판매 회복도 쉽지 않다. 적어도 자동차업계 평균인 2교대는 되야 할 공장은 아직 1교대도 풀타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연 16만대 이상은 판매해야 인력충원 수요가 생긴다. 회사는 이르면 2014년 말을 신차 출시 및 흑자 전환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는 노력하고 있다. 20일 무급휴직자들의 생활고 해소를 위해 본사 복귀를 전제로 한 협력사 취업한마당을 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이 이슈를 노동계의 표 정도로 밖에 인식하지 않은 듯 하다. 이미 일단락 된 쌍용차 사태 재검증이라는 명목으로 이슈화하고 있다. 사실상 ‘쌍용차 불매운동’이다. 반면 정작 무급휴직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19대 국회로 넘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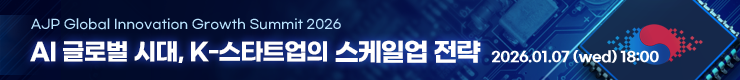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