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술원장과 인력개발원 사장 등을 역임하며 삼성의 혁신을 주도했던 손욱 차세대융합기술원 센터장(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빙교수)은 이렇게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 회장의 인재에 대한 집착은 삼성의 신경영을 성공하게 한 원동력이 됐다. 단순히 똑똑한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끊임없이 배우려고 응용할 수 있는 인재’를 원했다.
최고정보책임자(CTO)는 회사의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논의를 하게 된다. 이런 자리에서는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생소한 용어, 약자가 많이 나온다. 약자의 경우 CTO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의미와도 다르고 거래업체도 생소한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한 달만 이 분야의 전문용어를 접하지 않으면 회의를 할 수 없는 정도였다. 기술의 반감기가 1년에서 6개월을 넘어 지금은 한 두 달 사이에 바뀔 만큼 발전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반감기가 1년이라면 학생들이 대학에서 지식을 배워 나가면 1년 후에는 지식의 절반도 모르게 되며 2년 후에는 고작 10~20%밖에 모른다. 반감기가 6개월이라면 1년 후면 학생들이 아는 지식은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다. 요즘은 학교에서 열심히 배운 지식만으로 평생을 살 수 없다. 배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 교육계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오래전부터 ‘평생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단순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지식을 사회 전체에, 경제발전에 응용할 수 있는 안목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키워낸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지난 2000년부터 졸업장도 바꿨다고 한다. 예전에는 아는 게 많다, IQ가 높다, 팀플레이(시키면 따라 하는 것), 끈기 있고, 남이 시키는 것을 잘하고, 말 잘 듣고 눈치 있다 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바뀐 졸업장은 평생학습,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새로운 것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창의력 있고 눈높이 있고, 프리젠테이션 능력 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있고, 팀워크(남과 함께하는), 순발력, 책임의식 등을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졸업장은 “이 사람은 무엇을 공부해서 무엇을 해봤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다”를 보여주기 때문에 “무엇을 공부해서 학점이 얼마다”라는 한국의 졸업장과 차이가 있다.
삼성이 지난 2007년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으로부터 공학교육인증제를 취득한 공대 졸업생들에게 입사 인센티브를 주게 된 배경도 이와 유사하다. 전공 이외에 시스템을 생각할 줄 아는 인재, 각 부분의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시너지를 낼 때 멤버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직업적 도덕적 책임감, 공학적인 해결방안, 윤리의식, 경제·경영·환경·법률에 관한 시사적 논점들에 관한 기본지식 등을 모두 터득하라는 뜻이다.
더 나아가 삼성은 ‘태토(바탕흙)’를 갖춘 인재를 원했다. 삼성전자 출신으로 옛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한 진대제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스트 대표는 “영어 알파벳에 1에서 26까지 숫자를 붙여서 대응하는 숫자를 더하니까 100점이 나오는 단어가 ‘Attitude’(태도)라 했다. 태도가 중요하다. 융합하고 시너지 내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에서, 사고에서 나온다. 그런데 ‘Thought’(사고)의 대응숫자를 더해보면 99점이 나온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1%의 실천을 해야 한다. 실천을 보태면 된다. 이 Attitude가 생기려면 Thought와 실천이 없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끊임없이 채용제도를 개선하며 이루고자 한 것은 바로 태도를 갖춘 인재를 모으고 싶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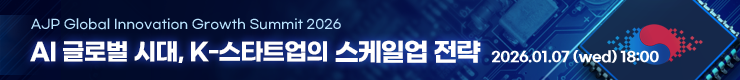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