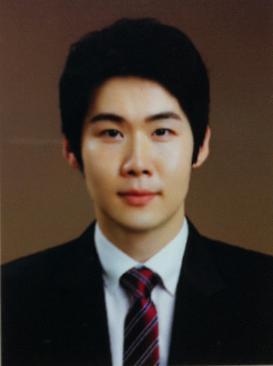
[조득균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됐다. 1979년 12단계로 2004년 이후 6단계로 나눠졌고 전력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차이가 최대 11배가 넘는다.
누진 단계는 월 100㎾h 단위로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0㎾h 초과)로 구분된다. 전기요금이 가장 낮은 1단계에서는 ㎾h당 60.7원을 부과하고, 가장 높은 6단계에서는 ㎾h당 전기요금이 709.5원이다.
우리나라 4인 기준 도시 가구는 봄과 가을에 월평균 342(㎾h)의 전력을 사용하고, 5만3000원가량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름철 1.84㎾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2시간씩 켜놓으면 전력 662.4㎾h를 추가로 쓰게 되고, 47만800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전력 사용량은 3배가량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9배로 늘어난 셈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큰 금액이다.
가정용과 달리 산업용 전기에는 누진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산업용은 ㎾h당 81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가정용은 105원이 발생한다. 서울 시내 상점들이 문을 열고 하루종일 에어컨을 켜놓은 채 영업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만큼 전기요금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야당과 달리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던 여당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가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선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전력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의 차이가 최대 11배가 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요즘 같은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무얼 망설이는 가.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손해 보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