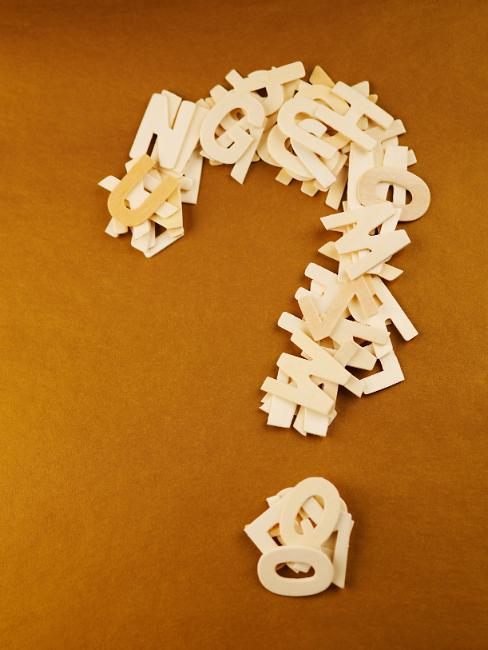
[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연일 '서민금융'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서민정책', '서민금융'이라는 말이 일반화돼 있지만 아직까지 '서민'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기 때문이다.
개별 업권 나름대로 '서민'을 정의하고 그에 맞춰 영업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민'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기준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반면 상호금융권은 중산층 이하인 보통사람, 저축은행은 은행 대출이 거부된 이들을 서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기관별로 서민금융 역할도 제각각이다. 특히 저축은행이나 대부업권의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대출금액을 언제든 편한 시간에 손쉽게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영업 전략을 펴왔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2012년에 발간한 금융교재 '똑똑한 금융 내비게이션'에서도 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을 '은행에 비해 대출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출이자가 은행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지난 2001년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을 봐도 점포 신설 규제 완화, 소액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용대출을 적급 취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느슨한 심사를 통해 돈줄이 막힌 저신용자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었다.
간편하고 신속한 대출을 강조하다보니 이들 업권은 그간 TV광고나 전화 상담을 통한 대출에 치중해왔던 게 사실이다. 대부업권도 마찬가지다. 제도권에서 탈락한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쉬운 대출 창구 역할을 거듭 강조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빚 권하는 폐습'을 정조준하고 서민금융의 패러다임을 전면 손질하고 나서면서 기존의 영업 방식은 한계에 부딪힐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1일 "서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과 더불어서 빚 권하는 폐습을 청산할 것을 주문했다.
기존 방식과 현 정부가 권하는 '서민금융'의 방향이 맞지 않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서민금융'이 무엇인지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정의해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금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니 시장에서는 혼란이 생긴다"며 "중금리 대출도 마찬가지다. 애초 은행과 대부업권 사이의 금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도입된 중금리 대출을 이제는 저신용자에게도 해주라고 한다. 명확한 게 없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서민을 정의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서민을 정의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다. 서민금융기관별로 각자의 역할과 타깃을 하는 고객이 달라 명확하게 칼로 자를 수 없다"며 "소득이 낮고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금융에서 보는 서민이지만 정확한 뜻이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