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팀은 제갈량이 첫번째 횃불을 들었던 박망파로 향했다. 박망파는 허난(河南)성 난양(南陽, 남양)시 서남부의 팡청(方城)현 보왕진(博望鎭)에 위치해 있다. 남양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남양무후사(武候祠)에서 차를 타고 50여분을 달려 박망파에 도착했다.
박망(博望)이라는 지명은 ‘넓은 곳을 우러러보다(廣博瞻望)’는 말에서 유래됐다. 이 지명은 전한시대 한무제(漢武帝)가 서역에 사신으로 보냈던 장건(張騫)을 박망후에 봉하면서 생겼다. 그리고 한무제는 장건에게 이 일대를 봉읍으로 하사했다. 지금은 좁은 비포장도로뿐이어서 자동차도 지나기 힘든 농촌마을이지만 과거에는 교통의 요지였다. 군사적으로는 군량미와 무기 보급을 위해 반드시 선점해야 하는 요충지였다. 이 마을의 큰 길은 이 지역을 빛낸 인물의 이름을 따서 장건가(張騫街)와 공명로(孔明路)로 불린다.
 |
| 장건교 앞에 있는 오래된 비석에는 '한고박망후장건봉읍'이라고 적혀 있어, 이 곳이 장건의 봉읍지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
장건이 생존했을 때 만들어졌다는 다리를 찾았다. 장건교(張騫橋)라는 이름의 이 다리는 근 21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튼튼해 보였다. 장건교 앞에는 ‘한고박망후장건봉읍(漢故博望侯張騫封邑)’이라고 써진 오래된 비석이 있었다. 그리고 장건교 옆면과 아랫부분에는 장건이 활약을 담은 벽화들이 조각돼 있었다. 그림에 나오는 장건의 모습은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수행하는 행렬은 다수였으며 주위사람들이 장건에게 양산을 씌워주고 있었다. 말과 수레에는 물건이 가득가득 실려 있었다. 코끼리 등 진귀한 동물들을 이끌고 오는 모습도 있었다. 거상 장건의 봉읍지였으니 박망파가 과거 얼마나 번화한 곳이었을지가 짐작이 갔다.
 |
| 아래에서 바라본 장건교의 모습. 2100년전 한나라시대에 만들어진 다리다. 여러차례 보수된 흔적이 있지만 한나라시대 다리의 모습을 아직도 지니고 있다. |
장건은 지금의 산시(山西)성 성고현(城固縣) 사람으로 기원 전 2세기 중국 한나라 때의 외교관이었다. 서역을 방문하기 위해 실크로드를 개척해 낸 주역이었다. 그는 한나라 때 서역으로 가는 남북의 도로를 개척했다.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의 견직물을 비롯한 많은 산물들이 서역으로 들어갔으며 서역으로부터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한혈마 (汗血馬), 포도, 석류, 복숭아, 당근, 보석, 산호 등이 중국에 들어왔다.
장건은 자신의 녹읍을 지키기 위해 박망성을 만들었다. 자신의 재력을 바탕으로 견고하게 만들었던 박망성은 200년후 삼국시대를 맞으며 화염에 휩싸이게 된다. 장건교를 둘러본 취재팀은 두대의 차가 지나가기에도 비좁은 비포장길을 달려 옛 우물터에 도착했다. 우물의 이름은 ‘이부싼옌징(一步三眼井, 일보삼연정)’이다. 하나의 우물이지만 우물구멍이 세개다.
 |
| 박망성터 안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일보삼연정의 모습. 이 우물은 유비가 만들었지만 우물을 두고 다툼이 잦아지자 제갈량이 우물구멍을 세개로 만들어 분쟁을 줄였다. |
동행했던 팡청현 문화국 부국장인 화윈제(华云杰)는 “이 우물은 유비가 만들었지만, 구멍을 세개로 만든 것은 제갈량”이라고 소개했다. 유비가 박망성에서 주둔하던 시절 가뭄이 들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비는 군사들을 불러 우물을 만들었다. 이 우물은 구멍이 무척 컸고 수원도 풍부해 백성들이 모두 좋아했다. 하지만 구멍이 너무 커 이용하는 사람들이 순서를 다퉜고, 잦은 마찰이 빚어졌다. 이를 본 제갈량은 하나의 우물에 구멍이 세개인 덮개를 만든 후 “하나는 관가용, 또하나는 민간용, 마지막 하나는 군대용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 우물의 이름이 ‘일보삼연정’이 됐다. 그리고 우물을 둘러싼 싸움은 잦아들었다. 제갈량의 지혜가 돋보인다.
우물을 뒤로하고 차를 타고 동쪽으로 1km정도 달리니 박망파가 나타났다. 박망파는 박망성 동쪽에 위치한 구릉지로 과거 이곳은 온통 갈대밭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갈량은 첫번째 화공을 펼친다. 박망파 전투는 제갈량의 데뷔무대였다. 그동안 제갈량에 대한 유비의 총애에 질시를 느끼던 관우와 장비는 공공연히 제갈량을 폄하했었지만, 제갈량은 박망파전투를 대승으로 이끌며 유비군 장수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된다.
208년 원소(袁紹)의 세력을 완전히 섬멸하고 북방을 평정한 조조는 부하 하후돈(夏侯惇)을 도독으로 삼고 우금(于禁), 이전(李典), 하후란(夏侯蘭), 한호(韓浩)를 부장으로 삼아 10만 대군을 이끌고 박망성의 유비를 격파하라고 명했다. 당시 박망성의 유비군은 5000명에 불과했다. 무려 20배의 병력이 들이닥치자 유비군은 크게 동요됐다. 그리고 이때 제갈량의 치밀한 작전이 빛을 발한다.
 |
| 박망파라고 적혀진 비석만이 1800년전 이 곳에서 박망파전투가 벌어졌음을 전해주고 있다. 비석에는 당시의 전투상황이 적혀져 있다. |
이 곳에는 박망파라고 쓰여진 비석이 놓여져 있다. 비석을 보호하려는 듯 주위에 둥그런 시멘트벽이 쳐져 있었다. 비석은 박망파 전투의 명성에 비해 초라한 크기였지만 깊이 패인 글씨가 특이했다. 박망파 비석에는 작은 글씨로 박망파 전투의 기록이 옮겨져 있었다.
제갈량은 당시 군사회의에서 관우에게 군사 1000명을 이끌고 박망파 왼쪽의 산에 매복하게 하고 장비에게는 군사 1000명을 주어 또 다른 산골에 매복하게 했다. 관평(關平)과 유봉(劉封)에게는 군사 500명을 주어 박망파 뒤 양쪽에 매복하게 했다. 박망파 바로 앞에 이르자 조운(趙雲)이 하후돈을 습격하고 하후돈은 조운을 추격한다. 박망파에 이르자 유비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하후돈을 공격한 후 조운과 함께 후퇴한다.
날이 저물때까지 유비와 조운은 계속 후퇴했고, 하후돈은 전진했다. 백전노장 하후돈이었지만 매복에 대한 경계심도 잊은채 하루종일 추격을 하면서 길을 잃고 갈대밭 깊숙한 곳에 들어서고 말았다. 유비군은 화공을 펼쳤고, 조운과 유비는 말머리를 돌려 하후돈을 공격했다. 후퇴하는 하후돈의 군사들은 장비의 매복과 관우의 매복을 차례로 맞닥뜨려야 했다. 하후돈은 군사를 태반이나 잃었고 마초와 군량 역시 모두 타버렸다. 유비군이 조조군을 상대로 거둔 첫번째 승리였다. 제갈량은 박망파전투로 인해 천하에 이름을 떨치게 된다. 나관중(羅貫中)은 삼국지연의에서 제갈량의 첫번째 횃불을 이렇게 묘사했다.
博望相持用火攻, (박망상지용화공, 박망파 대치중에 화공을 써 공격하니)
指揮如意笑談中 (지휘여의소담중, 지휘한 바 거짓처럼 뜻대로 이뤄지네)
直須驚破曹公膽 (직수경파조공담, 곧바로 조조 간담 철렁하게 놀래키니)
初出茅廬第一功 (초출모려제일공, 초가집을 나온 이후 첫공을 세웠구나)
 |
| 박망파 전투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전해지는 나무. 삼국수로 불리기도 하고 삼국고자로 불리기도 한다. |
박망파 비석과 가까운 곳에 까만색의 나무가 눈에 띄었다. 이 나무는 1800년전 박망파전투에서 화공이 펼쳐졌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무라고 한다. 나무를 둘러싸고 철제 구조물로 울타리가 쳐 있었고 싼궈구저(三國古柘, 삼국고자)라고 써져 있었다. 삼국수(三國樹)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세히 살펴보니 불에 타서 검게 말라비틀어져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다. 육중한 나무 여기저기에 나무근육이 꼬인 상태로 말라 있었다. 나무가 이정도로 불타버렸을 정도라면 당시의 화공이 얼마나 지독했음을 가늠할 수 있다. 불타는 갈대밭에서 화마에 집어삼켜진채 죽어갔을 병사들의 절규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하지만 1800년이 지난 지금 삼국수 위로는 파란 하늘에 순백의 구름이 도도하게, 그리고 천천히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발길을 옮겨 박망파 서남쪽으로 5㎞ 떨어진 작은 농촌마을을 찾았다. 이 곳의 이름은 메이린푸춘(梅林鋪村, 매림포촌)이다. 이 마을은 조조의 망매지갈(望梅止渴, 매실을 보고 갈증을 잊다) 고사가 유래한 곳이다. 197년 조조가 장수(張繡)를 치러 갈 때 병사들이 목말라 진군을 못하고 있자, 조조는 “저 언덕 나무에 매실나무 숲이 있다”고 외쳤다. 조조의 말을 듣고 매실을 떠올린 병사들의 입에는 침이 고였으며 잠시동안의 갈증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매실나무숲은 없었고, 망매지갈 고사는 조조의 기지를 칭송하는 이야기로 전해내려왔다. 이 지역 주민에 따르면 매림포촌은 한나라시대부터 마을이 존재했으며 부근에는 매실나무 숲이 있었다고 한다. 박망성을 거쳐 매림포촌을 나설 때는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저물고 있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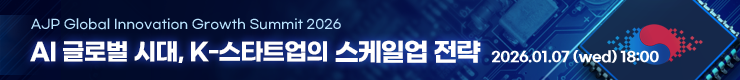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