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한글박물관은 오는 11월 27일까지 기획특별전 '광고 언어의 힘, 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사로잡혔다'를 개최한다. 최초의 상업 광고 '덕상세창양행고백'이 실렸던 1886년 2월 22일자 한성주보(소장자 신연수). [사진=국립한글박물관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키 큰 미루나무에서 울어 대던 매미 소리는 차라리 자장가/벌거송이 몇이서 낮잠을 잔다/그 매미 소리는 지금도 여전한데/모두들 어디 갔나 고향의 옛 친구들"(대우전자, 1984).
급격한 산업화로 농촌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던 30여 년전 국내 기업의 광고 카피는 이처럼 '그리움'과 '정'에 호소했다. 오늘날 광고는 어떨까. "이제, 분명해졌을 거야/이 도시가 빛나는 이유,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아모레퍼시픽, 2016). 독립적 주체로서의 개인을 직접적으로 부각시킨다.
캐나다의 미디어 이론가인 마샬 맥루한(1911~1980)은 광고를 일컬어 "20세기 가장 위대한 예술형식"이라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양한 시각 매체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광고는 그림, 사진, 영상 등의 시각적 요소로 당당히 그 가운뎃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확한 정보 전달로 소비자의 판단을 돕는 것은 역시 '말'과 '글', 즉 광고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광고가 '보는 것'을 넘어 '읽는 것'이 되고, 당대의 사회문화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초의 전면 광고 '영국산 소다'가 실린 1899년 11월 14일자 황성신문 [사진=국립한글박물관 제공]
국립한글박물관(관장 김철민)은 개화기부터 현재까지 130여 년 한국 광고의 역사를 다룬 기획특별전 '광고 언어의 힘, 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사로잡혔다'를 오는 11월 27일까지 개최한다.
그동안의 '광고' 전시가 사회 문제, 예술적 표현 등에 치우쳤다면 이번 전시는 광고에 쓰인 우리말과 글의 역사를 조명한다. 신문, 영상, 도면 등 광고자료 357점과 시대별 대표적인 광고 문구 283점 등 총 640여점의 자료는 규모만으로도 관람객을 압도한다.

1930년대 유한양행의 의약품 '네오톤 토닉' 광고 [사진=국립한글박물관 제공]
전시는 △1부 '광고를 읽는 새로운 시각, 광고 언어' △2부 '광고 언어의 말맛' △3부 '광고 언어의 글멋' △4부 '광고 언어, 우리들의 자화상' 등으로 구성된다.
전시장에서는 한국 최초의 상업 광고가 실린 '한성주보'(1886), '독립신문' 국문판과 영문판 광고(1896), 최초의 전면 광고인 '영국산 소다' 광고가 실린 '황성신문'(1899) 등 개화기 신문 광고를 비롯해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유한양행 의약품 '네오톤 토닉' 광고, 광고 글자 표현에 천착했던 고 김진평(1949∼1998)의 한글 디자인 도면 등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희귀 자료들이 일반에 공개된다.

1960년대 대한가족계획협회(현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캠페인 광고
[사진=국립한글박물관 제공]
특히 시대·제품별로 광고 레터링(문자 도안) 500여 개를 분류해 놓은 터치 영상은 눈길을 끈다. 이애령 전시운영과장은 "1950부터 2010년까지의 제약, 식품, 화장품, 자동차, 문화예술 등 9개 분야의 광고 글자들을 일일이 선별했다"며 "1970~80년대 황금기를 지나 90년대 하락세를 보이지만, 2000년 이후 복고풍 서체를 재료로 다시 활발해지는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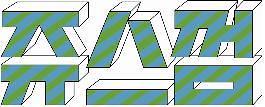
해태제과의 '쥬스껌'(1978) ⓒ프로프간다
[사진=국립한글박물관 제공]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김정우 한성대 교수, 한명수 배달의민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정철 카피라이터, 박선미 대홍기획 본부장 등이 전시 연계 교육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철민 관장은 "전시에 소개된 시대별 광고 언어와 콘텐츠는 향후 한국 광고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광고 언어가 한국 근현대사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염두에 두고 관람하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