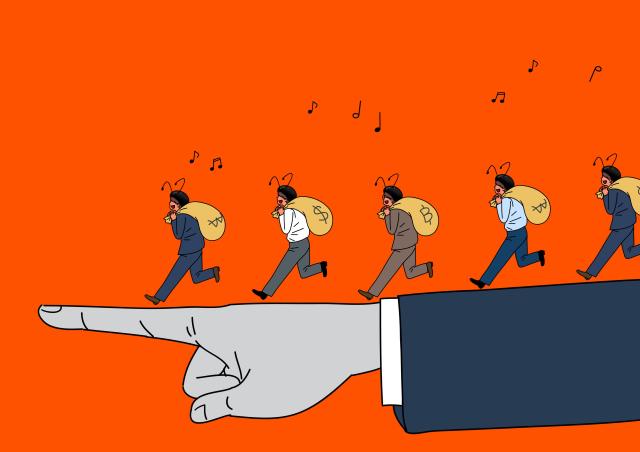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분기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이 지난 분기에 이어 감소를 이어갔다. 서학개미 등 국내 투자자(개인·기관)의 증권투자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주가 반등으로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6818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1651억 달러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이 가운데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8048억 달러)는 자동차·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투자가 지속되면서 264억 달러 불었다.
해외 증권투자(1조1250억 달러)는 1132억 달러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주가 상승 및 이에 따른 해외 주식투자가 확대되면서 지분증권(8446억 달러)이 956억 달러 늘고, 부채성증권(2804억 달러)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로 해외 채권투자가 지속되며 175억 달러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외금융부채는 전분기보다 2186억 달러 증가한 1조6514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 4분기(2403억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 규모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1조510억 달러)가 1860억 달러 불어나며 전체 부채 증가를 이끌었다. 세부적으로 지분증권(6204억 달러)이 1477억 달러, 부채성증권(4306억 달러)이 383억 달러 늘었다. 국내 주가가 큰 폭 상승하고, 장기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채권투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임인혁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국내 주가가 미국 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큰 폭 상승하고, 외국인의 채권 매수도 확대되면서 대외금융부채 증가폭이 대외금융자산 증가폭을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전 분기(1조840억 달러)보다 536억 달러 줄어든 1조304억 달러로 집계됐다.
임 팀장은 "거래 요인 측면에서는 해외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가 증가해 순대외금융자산이 늘었다"면서도 "비거래 요인을 함께 고려하면 국내 주가 상승률 차이에 따른 비거래 평가 손익 영향으로 부채 증가 폭이 자산 증가폭을 상회해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2분기 대외채무는 7356억 달러로 전 분기(6834억 달러)보다 521억 달러 증가했다. 단기 대외채무와 장기 대외채무가 각각 177억 달러, 344억 달러씩 늘었다. 단기 대외채무는 외국인의 단기 채권 투자 확대가, 장기 대외채무는 초장기채권 매입 수요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대외채권은 장·단기 채권이 모두 늘며 1조928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 분기(1조513억 달러)보다 414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단기 대외채권은 예금취급기관과 기타부문 중심으로 184억 달러, 장기 대외채권은 부채성증권 중심으로 231억 달러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2분기 순대외채권은 3572억 달러다. 전 분기(3679억 달러)보다 107억 달러 감소했다.
대외채권은 현재 국내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확정 금융 자산을 의미하며 대외채무는 확정 금융 부채를 의미한다.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지분, 주식과 펀드, 파생상품 등은 제외된다.
대외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단기외채 비율(단기외채/준비자산)은 40.7%로 전 분기 대비 4.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외채 건전성을 나타내는 단기외채 비중(단기외채/대외채무)도 22.7%로 0.9%포인트 높아졌다.
임 팀장은 단기외채 동향과 관련해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모두 전 분기 대비 상승했지만 이는 외국인의 국내 단기채권 투자 확대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두 지표 모두 최근 변동 범위 이내임을 고려하면 대외지급 능력과 외채 건전성 모두 양호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국내 주가가 2분기 중 미국 나스닥(17%), S&P500(10.6%)보다 높은 23.8% 급등하고, 지난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최종 확정되면서 외국인의 단기 채권 투자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며 "이 같은 외국인 채권 선호를 외채 위험으로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6818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1651억 달러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이 가운데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8048억 달러)는 자동차·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투자가 지속되면서 264억 달러 불었다.
해외 증권투자(1조1250억 달러)는 1132억 달러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주가 상승 및 이에 따른 해외 주식투자가 확대되면서 지분증권(8446억 달러)이 956억 달러 늘고, 부채성증권(2804억 달러)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로 해외 채권투자가 지속되며 175억 달러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1조510억 달러)가 1860억 달러 불어나며 전체 부채 증가를 이끌었다. 세부적으로 지분증권(6204억 달러)이 1477억 달러, 부채성증권(4306억 달러)이 383억 달러 늘었다. 국내 주가가 큰 폭 상승하고, 장기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채권투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임인혁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국내 주가가 미국 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큰 폭 상승하고, 외국인의 채권 매수도 확대되면서 대외금융부채 증가폭이 대외금융자산 증가폭을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전 분기(1조840억 달러)보다 536억 달러 줄어든 1조304억 달러로 집계됐다.
임 팀장은 "거래 요인 측면에서는 해외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가 증가해 순대외금융자산이 늘었다"면서도 "비거래 요인을 함께 고려하면 국내 주가 상승률 차이에 따른 비거래 평가 손익 영향으로 부채 증가 폭이 자산 증가폭을 상회해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2분기 대외채무는 7356억 달러로 전 분기(6834억 달러)보다 521억 달러 증가했다. 단기 대외채무와 장기 대외채무가 각각 177억 달러, 344억 달러씩 늘었다. 단기 대외채무는 외국인의 단기 채권 투자 확대가, 장기 대외채무는 초장기채권 매입 수요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대외채권은 장·단기 채권이 모두 늘며 1조928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 분기(1조513억 달러)보다 414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단기 대외채권은 예금취급기관과 기타부문 중심으로 184억 달러, 장기 대외채권은 부채성증권 중심으로 231억 달러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2분기 순대외채권은 3572억 달러다. 전 분기(3679억 달러)보다 107억 달러 감소했다.
대외채권은 현재 국내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확정 금융 자산을 의미하며 대외채무는 확정 금융 부채를 의미한다.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지분, 주식과 펀드, 파생상품 등은 제외된다.
대외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단기외채 비율(단기외채/준비자산)은 40.7%로 전 분기 대비 4.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외채 건전성을 나타내는 단기외채 비중(단기외채/대외채무)도 22.7%로 0.9%포인트 높아졌다.
임 팀장은 단기외채 동향과 관련해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모두 전 분기 대비 상승했지만 이는 외국인의 국내 단기채권 투자 확대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두 지표 모두 최근 변동 범위 이내임을 고려하면 대외지급 능력과 외채 건전성 모두 양호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국내 주가가 2분기 중 미국 나스닥(17%), S&P500(10.6%)보다 높은 23.8% 급등하고, 지난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최종 확정되면서 외국인의 단기 채권 투자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며 "이 같은 외국인 채권 선호를 외채 위험으로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