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화가 서용선이 지난해 작정하고 뉴욕에 들어가 그려낸 지하철 모습등 도시풍경을 주제로 9일부터 학고재갤러리에서 전시한다 |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거칠고 야생의 맛이 진하다. 붓으로 쓱쓱 내려긋고 대충 칠한 듯 한 그림인데 오히려 생동감이 넘친다. 최근까지 미술시장을 휩쓸었던 ‘사진같은 그림’ 극사실화에 강력한 일격을 선사한다. 대형 상업화랑에서 만난 그의 작품은 ‘그림이란 이런 것’이라며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 같다.
단종, 한국전쟁, 중국신화등 주로 인간과 역사화를 다뤄왔던 서용선(61)화백의 작품이다.
서울 사간동 학고재 갤러리는 본관 신관을 내주며 9일부터 서화백의 개인전을 연다.
현장에서 스케치해 담아낸 강렬한 색감과 과감한 필선으로 풀어낸 작품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다. 도시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맞물려 살아가는 현대인의 실존과 시대의 풍경을 보여준다. 도시의 제도 관습 욕망의 역사가 까칠하게 담겼다. 그래서일까, 전시 타이틀은 ‘시선의 정치’다.
이번 전시에 선보인 작품들은 2003년과 2006년 여름 두차례의 베를린 방문시 작업한 역사적 현장을 다룬 작품과 2010년 여름 호주 멜버른의 카페와 거리를 주제로한 작품, 2010년 가을과 겨울 뉴욕에서 거주하며 지하철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이어진다.
이전의 도시연작이 서울의 산업화 기계화 과정을 담고 있었다면 이번 신작들은 서구 도심속 역사의 현장과 이방인들의 다양한 삶을 관찰했다.
2010년 하반기를 뉴욕에서 보내며 핏줄처럼 도시를 이루고 있는 뉴욕의 지하철에 주목했다. 그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제하면서도 대량으로 실어나르는 지하철이야말로 지금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가 아닐까 싶다”고 작업 의도를 설명했다.
“90년대부터 뉴욕지하철을 보아왔는데 작정하고 그리기위해 지난해 뉴욕으로 갔습니다. 몇 달동안 뉴욕에 머물며 지하철을 들락거리며 현장에서 스케치하고 근처 작업실에 돌아가 완성한 그림입니다. 밀폐된 지하공간속에 울려나오는 지하철 쇳소리의 울림은 공포스럽기까지하면서도 도시의 신령적인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학고재 본관에 전시된 서 화백의 뉴욕 지하철풍경은 획일화되고 계량화되는 도심속 인간들을 반영했다. 특히 그의 작업세계 특징인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다. 도시를 치받고 있는 뼈대같은 지하철 기둥과 골조는 격자무늬의 구축적인 공간분할로 눈길을 끈다. 작품은 전시장 천장의 서까래와 어울려 웅장한 울림을 준다.
 |
| 뉴욕지하철 New York Subway.2010.Acrylic on canvas.244x622cm. |
반면, 서화백이 담은 인물들은 무겁고 생기없는 모습이다. 도심에서 개개인의 기호와 정체성이 상실되어 익명화된 사람들. 그 속에는 타인과 나누는 시선의 교차도, 타인과의 미세한 정서적 교감도 감지하기 어렵다. 수많은 대중들이 군집하며 살며 각각의 정체성과 개성이 획일화되는 도시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실존과 상황의 현실이 조금 다를 뿐 뉴욕도 베를린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탄 사람들로 부대끼고 있다.
“도시의 지하철을 만드는 것은 이미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도시민들을 이리저리 옮겨놓는 신체의 자본화 되어가는 계산속에서 탄생하는 통로이며 구조지요. 밀폐된 공간속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마주보고 있어야 하는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신문을 읽거나 광고를 보는 척 하거나 핸드폰을 들여다 보거나, 서로의 시선을 애써 피한채 허공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무언극의 연극배우들 아닐까요?.”
작고 왜소한 체격이지만 서화백은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다부진 모습이다. 질기고 성긴 작품은 녹록치 않았던 그의 삶과 닮았다.
“서울 변두리에서 가족들과 힘들게 살면서, 팽창되는 도시화의 그늘을 체험했습니다. 60년대 중학교 때부터 자유당 정치 폭력의 영향권에 있었던 동네 건달들과 어울려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어요. 정릉 똘마니라는 별명도 그때 생겼고요.”
어릴적 서울 변두리 미아리와 정릉의 빈민촌에서 살았던 그는 공동묘지 앞에 텐트를 치고 자고 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다. 대학에 세 번이나 떨어지고 화가가 된 것은 이중섭 때문이었다.
고교를 졸업한 70년대 당시는 중동바람으로 중장비 기술이 최고였다. 중장비 학원을 알아보려고 신문광고를 훑어보다가 귀퉁이에서 발견한 이중섭의 기사. 가난한 예술가의 열정을 보고 난생 처음으로 ‘정신적인 가치’에 대해 생각했다.
항상 뒤처지고 낙오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열정으로 바뀌었다. 인생이 바뀐 순간이다. 그렇게 남들보다 4~5년 늦게 24세에 (서울대)미대를 들어갔고 그곳에서 22년간 교수로 지냈다.
하지만 갑갑했다. “그림에 집중하고 싶어” 2008년 서울대 교수직을 때려쳤다. 이후 해외를 돌아다니며 ‘자유로운 영혼’이 됐다. 하루 12시간씩 작업하고, 책을 읽고, 그림 그리고, 전시하고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인생을 되돌아보며 낯뜨거울 정도로 후회하는 순간이 두가지가 있어요. 어릴적 건달로 놀며 여자를 쫓아다니던 것, 그리고 대학에서 보직한 것.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식의 공백과 문화의 결핍으로 아직도 불안합니다. 이제야 생각이 세밀해졌지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
| 케이크 고르는 남자 A Man Picking a Cake.2010.Acrylic on Korean paper.141.5X76.5cm.jpg |
서화백은 2009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해의 작가’전을 가졌다. 학고재와 전시는 2년전 마이애미아트페어에 출품한 인연이 됐다. 우찬규 대표는 “당시 출품작품이 솔드아웃 됐고 개념미술로서 해외 컬렉터들의 반응이 대단 했었다”고 말했다.
‘죽음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를 강하게 할 뿐’이라고 했던가. 거칠고 투박하게 담아낸 이번 전시에는 도시속에서 케이크를 고르고, 지하철을 기다리며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의 시대의 초상이 담겼다. 회화 36점과 4m 크기 육송으로 만든 입체설치 작품등 등 총 42점을 볼 수 있다. 전시는 4월10일까지. (02)720-1524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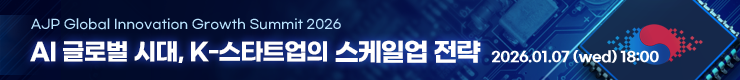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