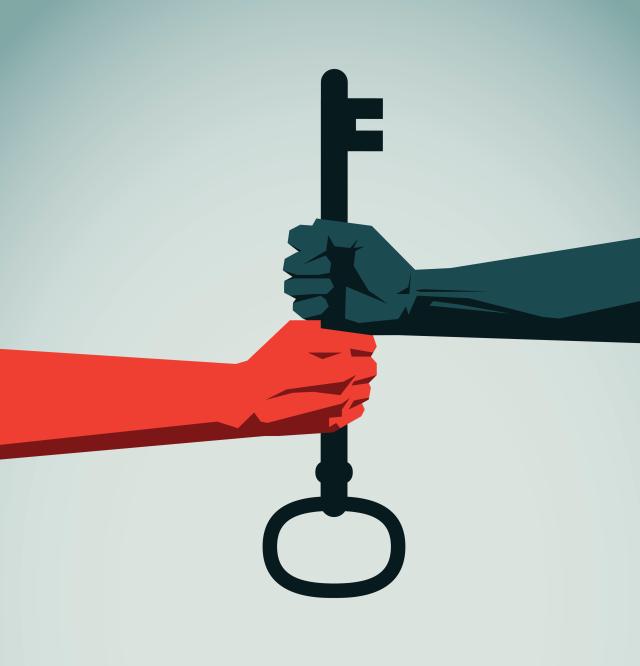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사모펀드로 변경된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샘의 시가총액은 사모펀드 인수 전 2조1557억원에서 현재 1조767억원으로 1조790억원(50.05%) 줄었고, SK증권은 3745억원에서 2226억원으로 1519억원(40.56%) 감소했다. 롯데손해보험 역시 6920억원에서 5934억원으로 986억원(14.25%) 줄어드는 등,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들의 시가총액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고점 매수에 따른 손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는 2021년 말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경영권 지분 27.7%(652만 주)를 1조45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한샘의 주가는 10만원 안팎이었지만, IMM PE는 주당 22만2550원에 매수하며 약 10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했다.
당시 한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구 및 인테리어 업계의 호황에 힘입어 시가총액이 2조원대에 달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건설·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이사·인테리어 수요가 급감했고, 가구 업계 전반이 불황에 빠지며 한샘은 2022년 적자로 전환됐다.
2023년 8월, 한샘은 김유진 IMM오퍼레이션즈본부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해 고강도 비용 절감을 추진한 결과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인력 감축과 연봉 삭감으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 2021년 기준 2540명이었던 한샘 직원 수는 지난해 3분기 2055명으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1인 평균 급여액은 60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감소했다.
제이앤더블유파트너스는 2018년 SK증권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3210만1720주(지분율 10%)를 515억39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현재 이 지분의 가치는 220억원대로, 매입 당시보다 반토막 넘는 평가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SK증권은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과거 SK그룹 계열사였으나 지난 2015년 SK그룹이 지주사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 받았다. 이로 인해 SK그룹은 SK증권 지분을 정리하게 됐다.
제이앤더블유파트너스는 SK증권을 인수 8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SK 브랜드 사용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SK 간판 없이는 홀로서기가 어렵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이유다. 여기에 더해 SK증권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손실 764억원, 순손실 525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다. 상반기에만 524억원 가량의 PF 관련 충당금을 적립한 영향이 컸다.
JKL파트너스는 2019년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하며 2차례에 걸쳐 총 7300억원을 투자해 지분 77%를 확보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지분의 가치는 4570억원 수준으로, 투자금 7300억원 대비 2700억원 이상 감소한 상태다.
롯데손해보험은 JKL파트너스 인수 이후 경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업계 불황의 벽을 넘지 못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보험 가입자 감소와 지급 여력비율(RBC)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규제 등으로 보험업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주인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희망 매각 가격이 현재 롯데손해보험의 지분 가치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매각 가격으로 약 2조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KL파트너스는 지난해 7월 이후 롯데손해보험의 '상시 매각 체제'를 도입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면 가격 및 조건을 합의해 매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IMM PE, JKL파트너스와 같은 굴지의 사모펀드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수 당시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고점에서 인수한 기업들은 업황 악화와 구조적 문제로 실적이 하락하고, 시가총액도 크게 줄어들었다. 사모펀드의 본질인 투자기업의 기업가치를 높여 매각해 이윤을 추구하는 전략이 막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PEF 관계자는 "특히 LP(자본 제공자)들은 3년 차부터 수익을 요구하는데, 많은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자금이 묶여 있다"며 "엑시트를 강행하면 손실이 확정되고, 추가 자금 투입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려 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어 GP와 LP 모두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